전문가칼럼
태동철(57회) 옹진문화원장/추석, 가족 그리고 우주의 질서 속 일상
본문
추석, 가족 그리고 우주의 질서 속 일상
– 냄새로 기억하는 귀향의 철학 –
신미균의 ‘시‘ 〈가족〉을 읽으며
추석이 되면 집집마다 부침개가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들기름에 지진 지짐이의 냄새와 프라이팬에서 나는 소리는 계절의 첫 인사처럼 다가와, 사람을 오래된 시간으로 데려갑니다. 어릴 적 마루 끝에서 지짐이를 받아들던 기억,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나누던 식탁의 온기가 냄새 하나로 되살아납니다.
올해 추석에는 신미균 시인의 〈가족〉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 시에서 ‘가족’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돌아감’의 의미로 확장됩니다. 시인은 평범한 일상의 정적 속에서 존재의 단서를 찾습니다. 닫힌 베란다 유리창, 그대로 남은 편지, 출입문에 붙은 광고지 같은 일상의 정적(靜寂) 속에서, 시인은 부재의 냄새를 감지합니다. 이 정적인 상태는 집에 아무도 '없음'을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하며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딸깍, 여는 순간, 집안에 있던 냄새들이 와락, 안깁니다. 부재를 확인하는 정적인 행위는 문이 열리는 역동적인 순간을 거쳐 따뜻한 포옹의 감각으로 치환됩니다.
이 시는 아무도 없는 정적 속에서 오히려 존재의 온기를 불러냅니다. 시각이 아닌 후각으로 기억을 복원하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족의 본질임을 알려줍니다. 삶이 멈춘 듯 보이는 순간에도, 냄새 하나로 존재의 의미와 귀향의 감각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냄새를 통해 이야기하는 이 ‘돌아감’의 의미는, 나아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순환의 질서와 맞닿아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반자 도지동(反者 道之動)”이라 했습니다. 세상 만물이 기울고 사라져도 다시 순환하고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자연의 질서이자 인간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신미균의 시는 이런 도의 순환을 가족의 냄새와 일상의 온기를 통해 구현합니다. 그 냄새는 단지 감각이 아니라, 존재를 소환하는 철학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서양의 시간은 곧장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동양의 시간은 순환하고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달이 그렇고, 계절이 그렇고,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향으로, 식탁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냄새처럼 남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낮이고 하늘은 흐립니다. 오늘 밤 달이 모습을 드러낼지 알 수 없지만, 밤이 오면 달빛은 바다처럼 번질 수도 있고, 구름에 가려 은은히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밤이 찾아온다 해도 사람들은 그 빛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부침개를 굽는 냄새처럼 가족의 체온과 귀향의 약속이 사랑으로 스며 있습니다. “냄새만 안고 있어도 따뜻하다”는 이 한마디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좌표는 어디인지를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인/한규동
[시 원문]
〈가족〉 / 신미균
베란다 유리창이 다 닫혀있으면
집에 아무도 없는 거다
편지꽂이에 편지가
그대로 꽂혀 있으면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온 거다
현관문에 피자집 광고지가
그대로 붙어 있으면
정말로 없는 거다
그래도 혹시나
벨을 눌러 본다
아무런 기척이 없다
혼자서 현관문을 딸깍, 열면
집안에 있던 냄새들이
와락,
안긴다
냄새만 안고 있어도
따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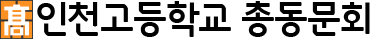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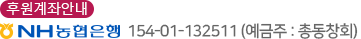











댓글목록 0